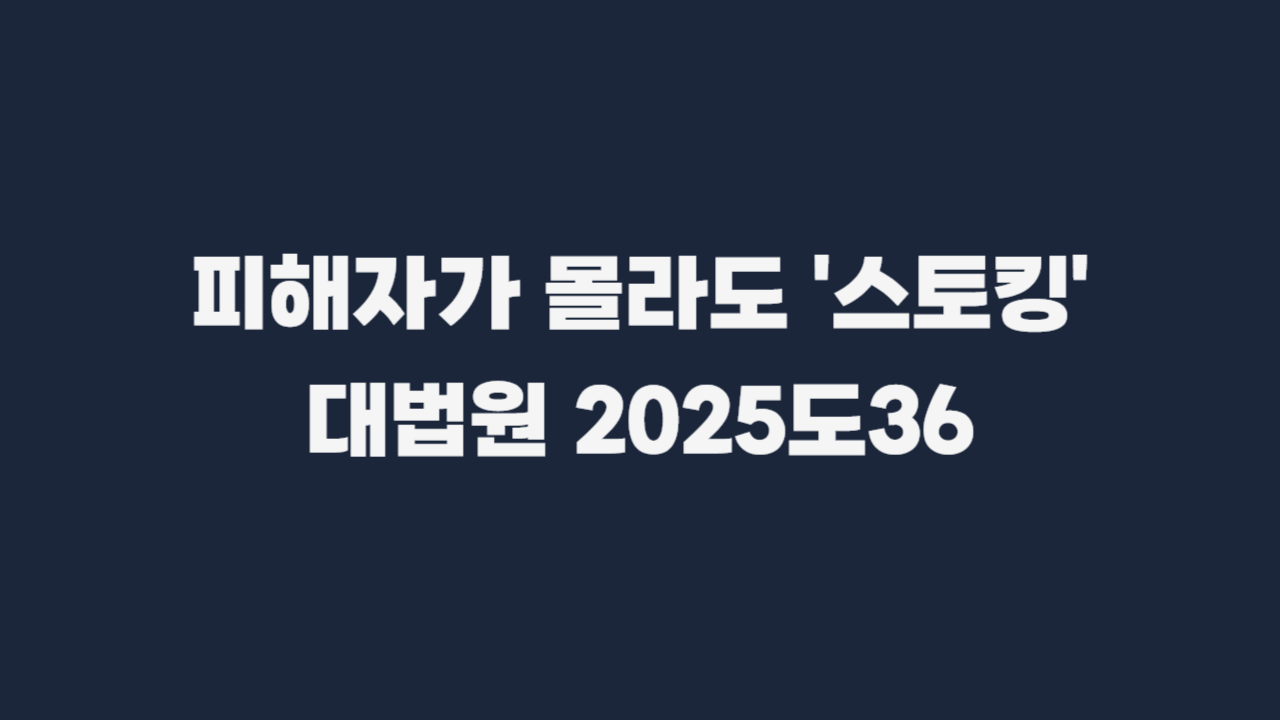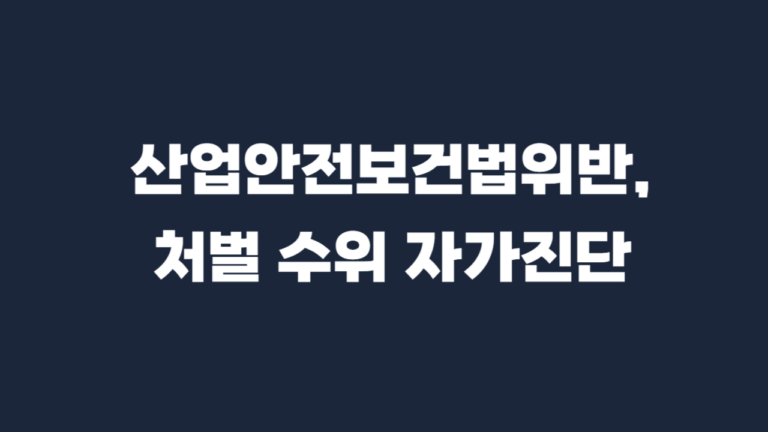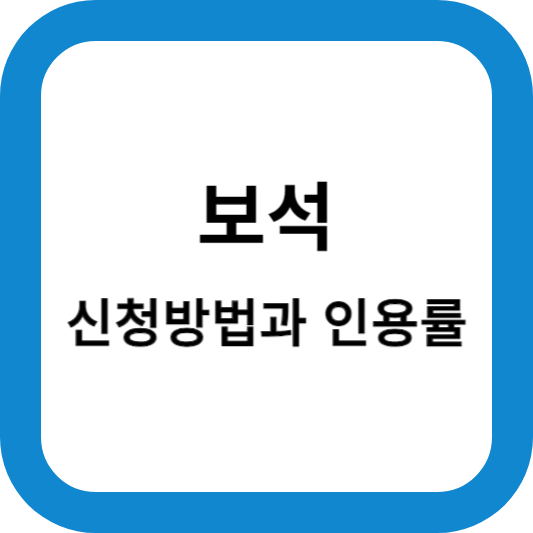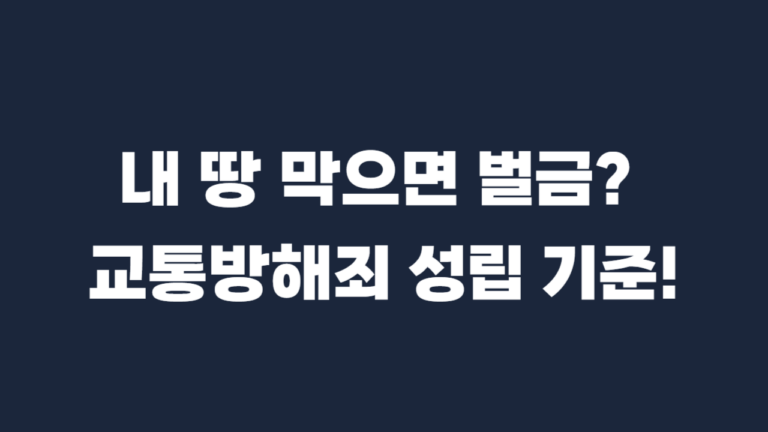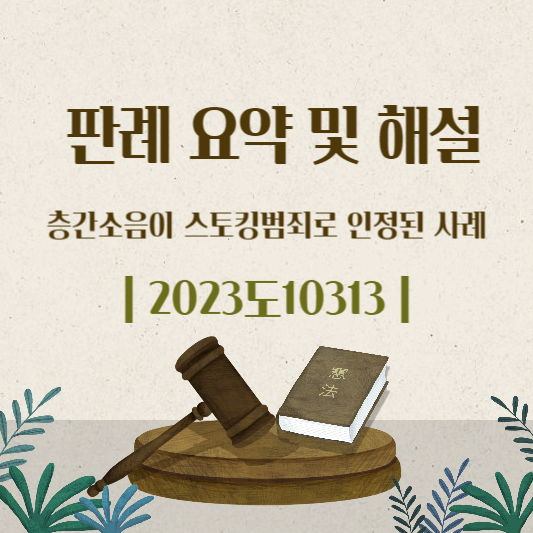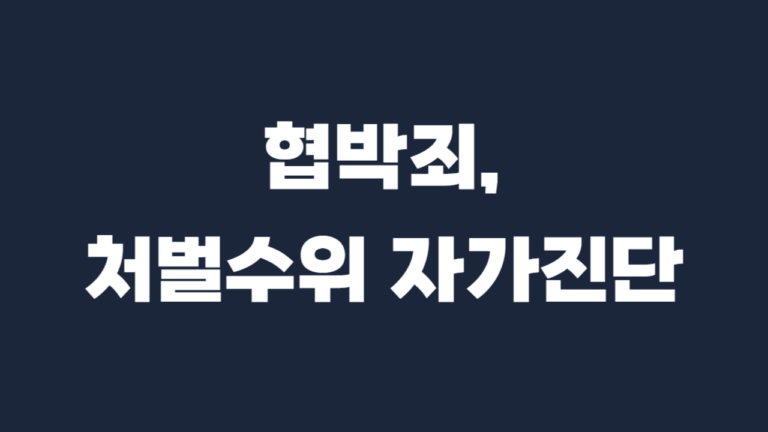스토킹 행위, 피해자 몰래해도 처벌 (대법원 2025도36 판례)
대법원은 2023년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해석하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지 않았더라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스토킹행위를 피해자가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에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이번 판결의 의미에 관하여 자세히 보겠습니다.
판결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
피고인은 10여 일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어떤 날은 24시간 이상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1, 2심 및 대법원의 판단: 스토킹범죄 성립
1,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에 해당한다고 기존의 판시를 다시 한 번 밝히면서 1, 2심의 판단은 스토킹범죄 법리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문제의 소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의 요건 중 하나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실제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 위험범 인정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3년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가 있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지 않더라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 판시에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있는 이상 피해자가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시 위험범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기존 위험범의 법리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법리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토킹범죄가 위험범인지에 관한 관한 대법원 2023도6411 판결 요약 및 해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판시는 실제 사례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과 같이 미행사실을 피해자가 알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가 스팸메시지나 스팸메일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가 없는 집 앞에 서 있거나 그것을 피해자가 알지 못한 경우 등까지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핵심 요약
- 위험범: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 실제 불안감, 공포 불필요: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피해자가 실제 불안감,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스토킹범죄는 성립합니다.
- 인식 불필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차단해서 메시지를 못 봤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5도36)에 따르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그 메시지를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행위이고 이것이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차단한 경우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 없는데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예,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