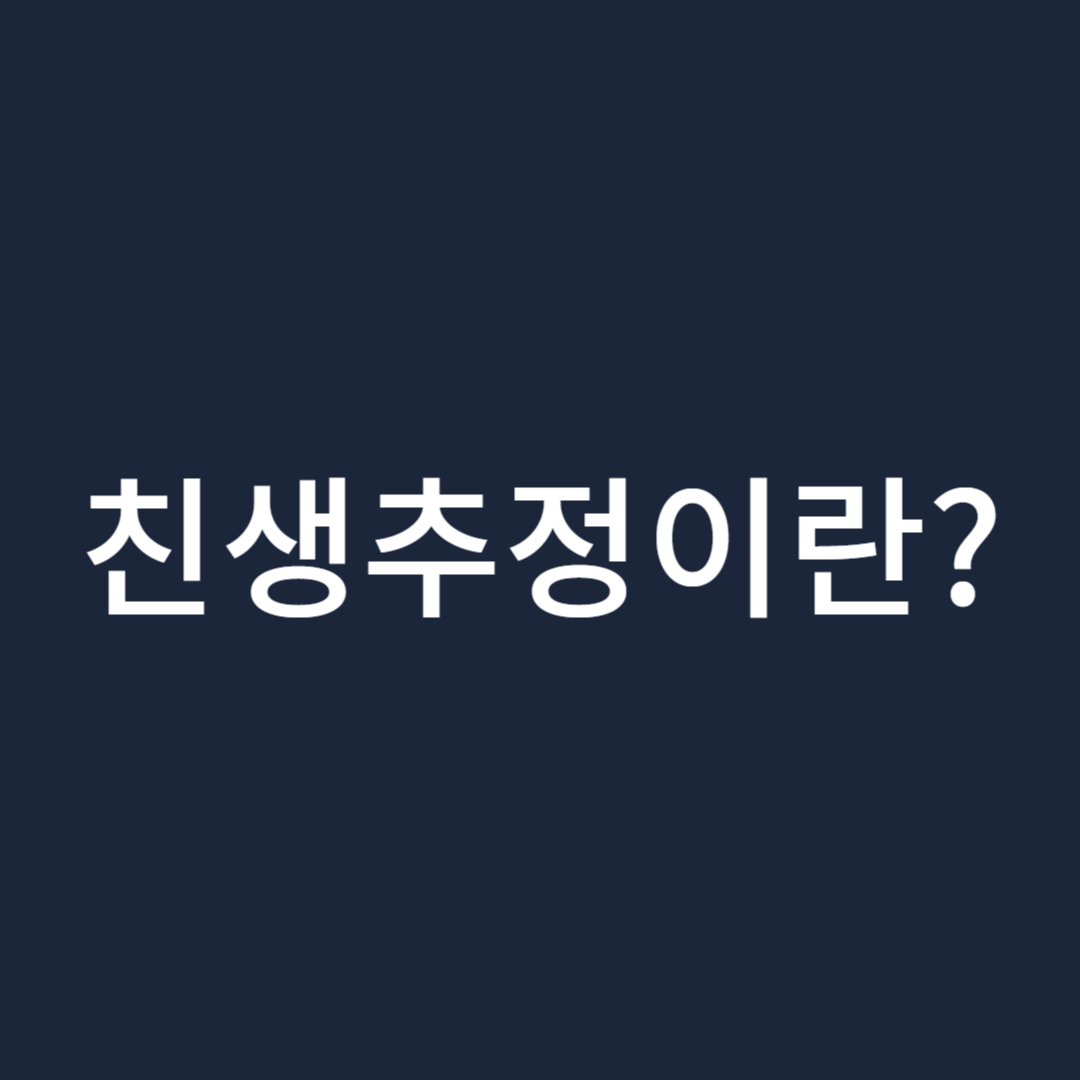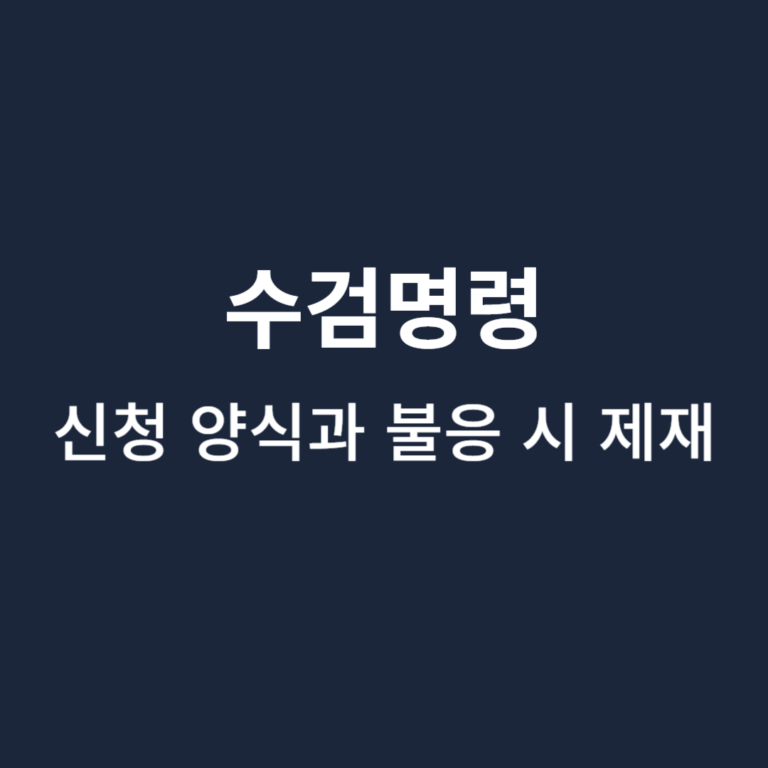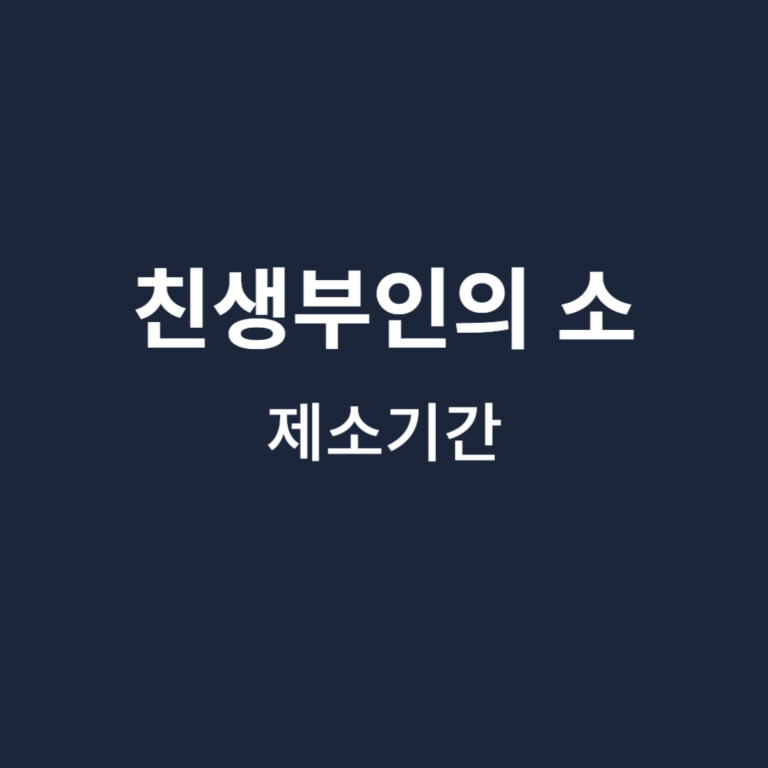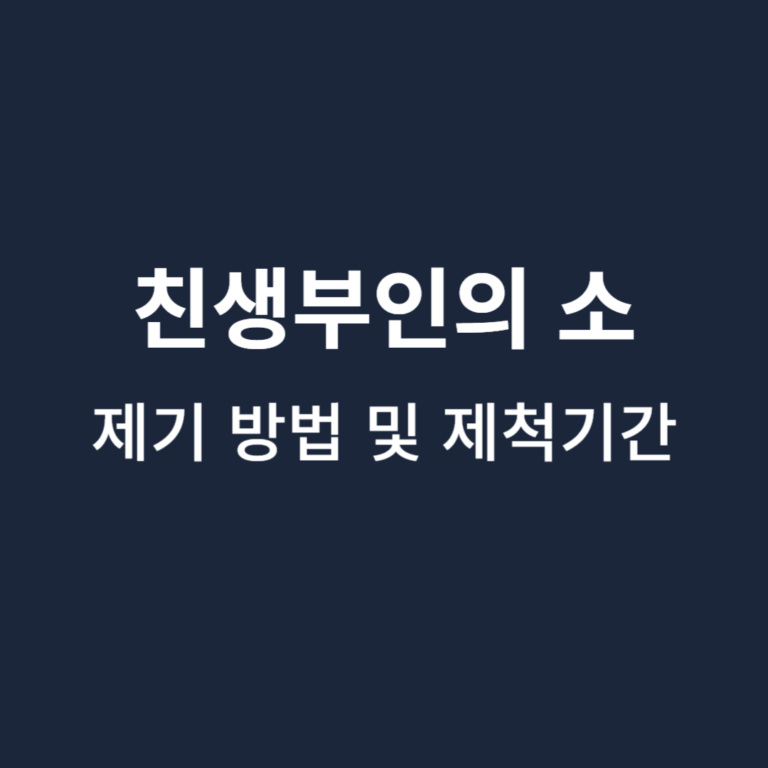친생추정이란? 깨지는 경우와 예외 인정 판례 모음
‘친생추정’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친생자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민법에서의 ‘친생추정’은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임신된 아이는 특별한 증명이 없어도 남편의 자녀로 본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평화와 아이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친생추정이란?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상 친생추정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본다는 법률상 추정’을 의미합니다. 법률상 추정은 법이 일정한 요건이 추정되면 특정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발생하고,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라는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야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생추정은 이러한 인지 절차 없이 친생추정의 요건만 충족되면 법률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인정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친생추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정이 깨지지 않는 이상 누구도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친생추정의 요건
친생추정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혼인기간 중에 임신되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 자녀가 혼인성립일부터 200일이 지난 후 출생하였거나
- 혼인 해소된 날 또는 남편 사망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
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혼인성립일은 혼인신고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인 해소일의 경우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날 이혼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혼신고일을 의미합니다.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한 경우는 판결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조정성립일이 혼인해소일이 됩니다.
친생추정의 효과
친생추정의 효과가 발생하면 친생부인의 소로 친생추정이 깨지지 않는 이상 누구도 친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속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친자로 취급이 되고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는 친자 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친생추정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아내가 제3자와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 아내와 제3자가 부모로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친자로 추정이 되므로, 제3자를 아버지로 한 출생신고는 부적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녀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있는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들 중 1명이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의 친자녀가 아님이 밝혀지더라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누구도 그 자녀가 친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친생추정이 깨지지 않는 이상 다른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됩니다.
다만 유의할 부분은 이러한 친생추정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만 적용됩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는 친생추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와 자녀로 기재된 경우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자관계를 다툴 수 있고, 상속관계 소송 등 다른 소송에서 곧바로 친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깨지는 경우
친생추정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부인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민법 제846조,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과 아내(아이의 친모)만이 제기할 수 있고,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달리 소 제기권자와 소 제기 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친생추정의 예외(친생추정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 판결
부부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이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
대법원은 자녀가 혼인 중이 임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친생추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예외 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서(동거)의 결여로 부인이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에 자녀가 임신되었어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친생추정의 효과를 고려하여 어느정도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본 판례처럼 해외로 나가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동서의 결여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 친생추정이 문제되는 사안은 대부분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소 제기권자와 제소 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친자관계가 다투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친생부인의 소에서 친생추정을 깨뜨리는 사유이지 친생추정을 아예 발생시키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추정의 예외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음
- 무정자증 남편을 둔 아내가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과가 발생하고,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1년에 한 번정도 아내가 있는 본가에 방문하여 만났던 사안에서 동서의 결여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친생추정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한 사례(실제 함께 잠을 잤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함)(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므637 판결)
- 아내가 가출한 지 2년 2개월 후에 출산한 사안에서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