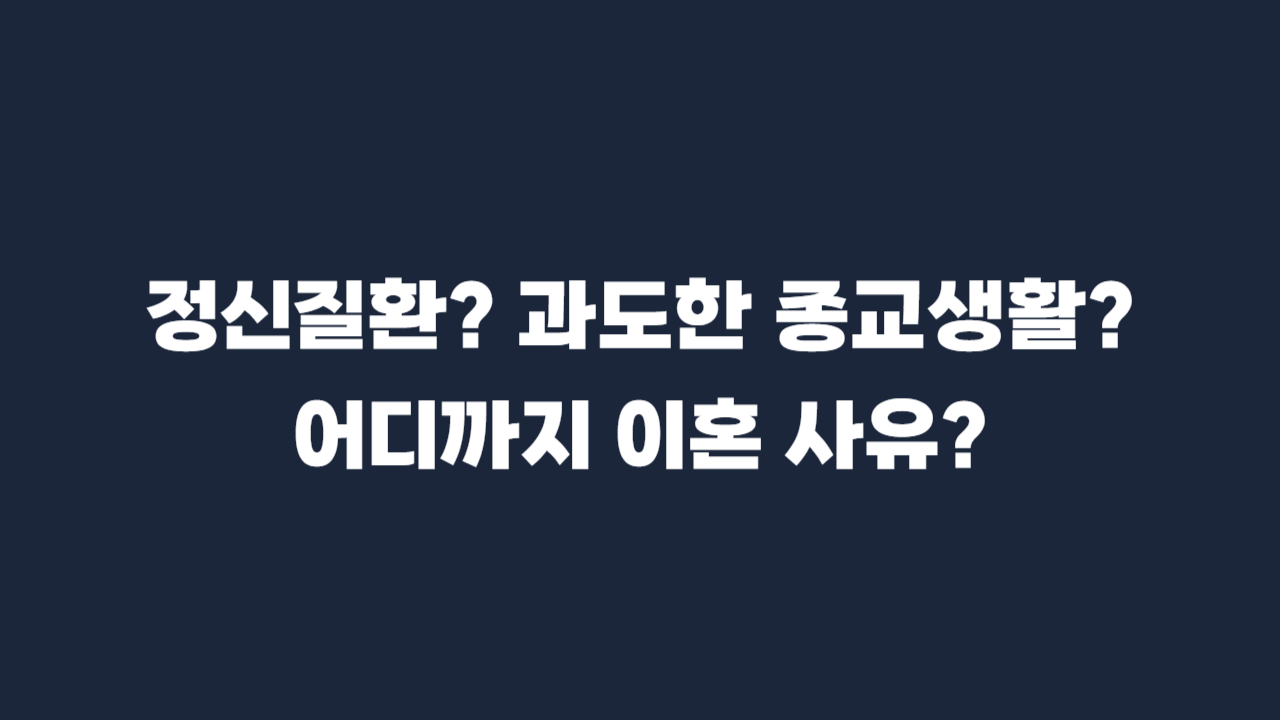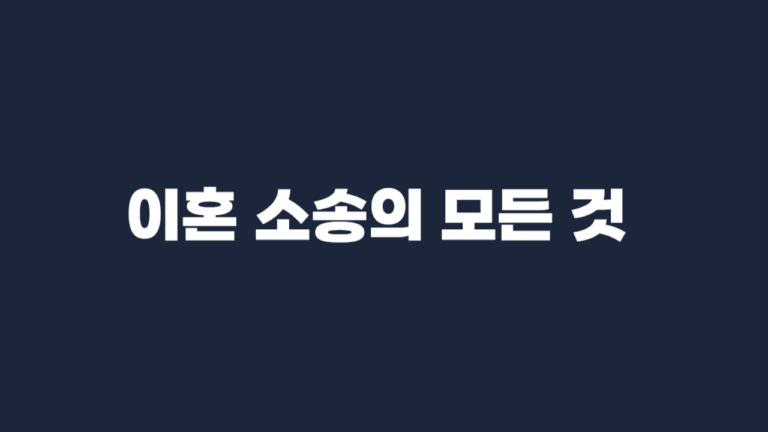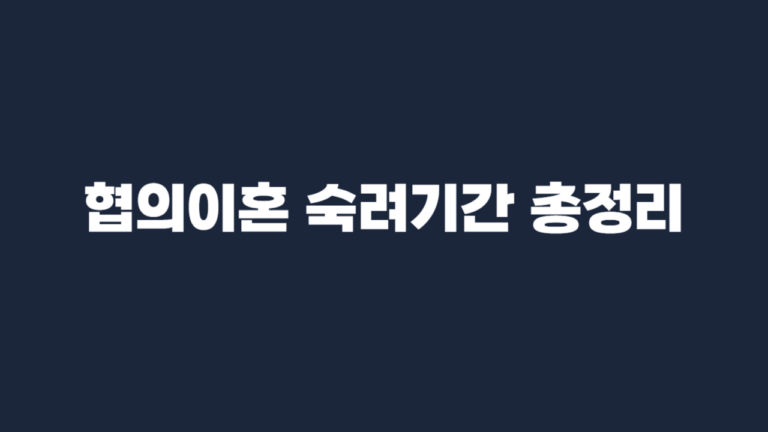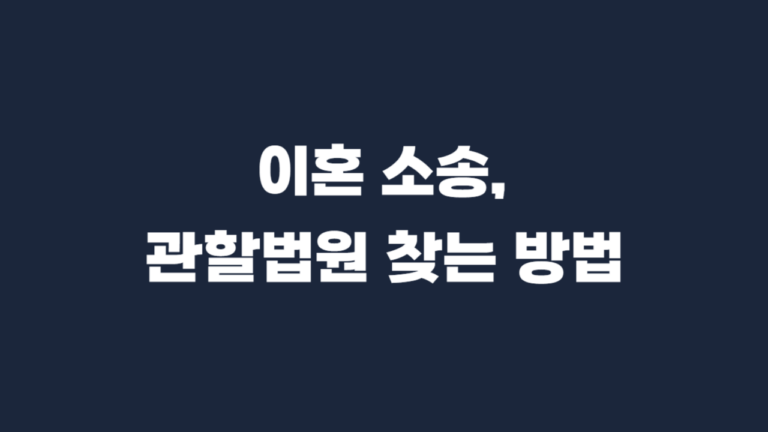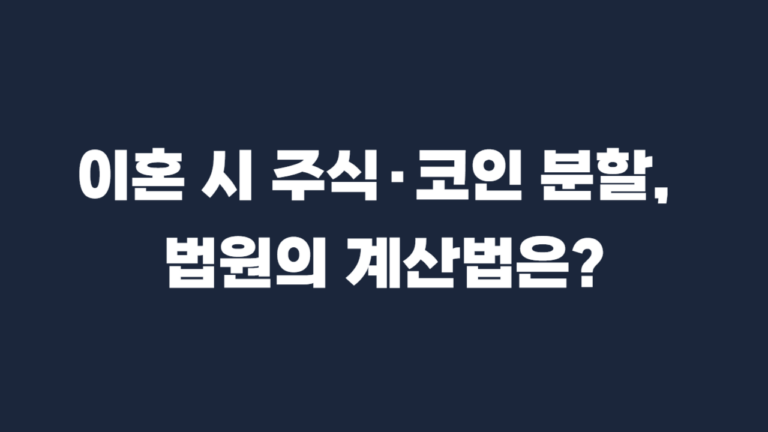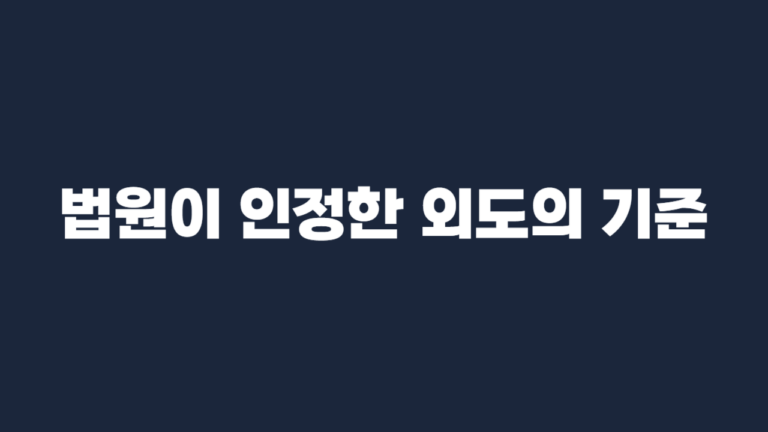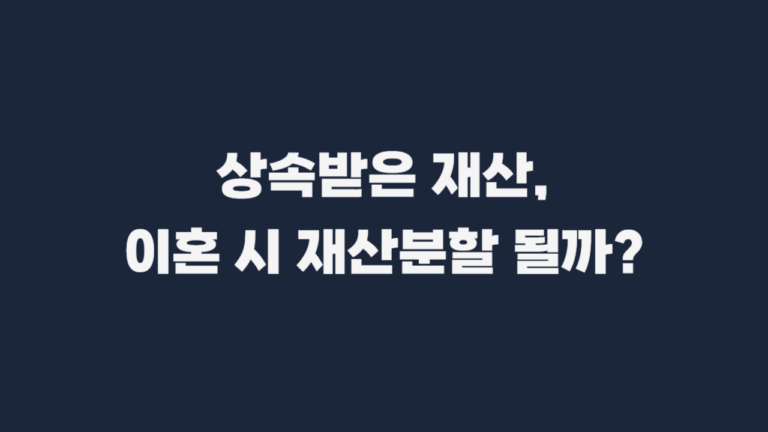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란? (도박·정신병·종교 판례 총정리)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의 잘못이 민법에서 정한 명확한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폭행 등)에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종교 갈등, 성생활 문제, 배우자의 심각한 질병 등 복합적인 이유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법적으로 이혼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포괄적인 이혼 사유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 제6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정신병, 성생활, 도박, 종교 등)를 이혼 사유로 인정했는지 판례를 통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판단 기준)
법원이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다음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
- 파탄의 경위 및 지속 기간, 회복 가능성
-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유책성) 유무와 정도
-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 이혼 후의 생활 보장 문제
- 당사자 간의 문화적 특성과 감수성 차이(국제결혼의 경우)
제6호 사유로 인정된 구체적 사례 (판례)
법원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다양한 사정을 제6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심각한 정신 질환 또는 질병
원칙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신병이나 질병은 원칙적으로 가족이 함께 돌봐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여 가정생활 전체가 파탄에 이른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불치의 정신병에 걸려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다른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과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요구하며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이 치료가능하더라도 배우자가 필요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례
- 인정사례
- 부정사례
- 정신분열증: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9 판결
- 우울증: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 아내가 남편과 시어머니 등을 폭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을 이혼사유로 인정한 원심에 대하여 아내의 행동이 정신병인한 것인지, 정신병으로 인한 것인 경우 치료가 가능한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이혼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2. 심각한 성생활 문제 (섹스리스 등)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나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인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지,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이혼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그리고 대법원은 무정자증이나 임신불능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 인정 사례
- 13년간 전혀 성생활을 하지 못했음에도 그 원인을 파악하거나 치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여 별거에 이른 경우(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 부정 사례
- 혼인 후 2년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 7년 이상 성관계를 못해 별거한 사안(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대법원은 성적 결함이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당사자가 치료 노력을 했는지 등을 더 심리하여 파탄의 주된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무정자증: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므36 판결
- 처의 임신불능: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므37 판결
- 심인성 발기부전증: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621(본소),638(반소) 판결
3. 과도한 종교 활동 및 경제적 파탄
부부사이에도 신앙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과도하여 부부로서의 의무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정 사례
- 처가 특정 종교에 너무 심취하여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시어머니와 싸우고 가출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므51 판결)
-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 부정 사례
-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므26 판결)
-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매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그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서울고등법원 1990. 2. 23. 선고 89르3755 판결)
- 여호와의 증인 교인으로서 최소한의 교리연구와 예배활동만 하고 포교활동 등 다른 적극적인 종교활동은 자제하면서 가정주부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충실하게 한 경우(서울가정법원 1988. 10. 10.자 87드6835 심판)
4. 경제적 문제 야기
대법원은 경제적인 문제도 가정경제에 위협이 되고,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정 사례
- 계돈 문제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되었음에도 가사를 소홀히 하고 과도한 계를 조직한 행위(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므50 판결)
- 도박과 투기적 경제활동으로 상대 배우자까지 신용불량자로 만든 사례(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 평생모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의 반대에 불구하고 자녀 중 1명에게 모두 증여한 경우(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이 판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남편이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정 사례
- 배우자의 인장을 도용하여 배우자 재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가정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므56 판결)
이혼 청구 기간 (제척기간)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이혼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2조). 이 기간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어야 하는 ‘출소기간’입니다.
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6개월/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기간 제한 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예를 들어, 상대 배우자가 상간자와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핵심 요약
- 제6호 사유란: 법률에 열거된 사유(1~5호) 외에, 혼인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가혹한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구체적 사례: 불치(不治)의 심각한 정신병, 장기간의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가사와 육아를 방치하는 과도한 종교 활동, 경제적인 배신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제척기간: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해야 합니다. 단, 파탄 사유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단순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단순한 성격 차이는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여, 부부관계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크지 않은 이상 이혼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부정행위를 한 지 2년이 지나 제1호 사유(부정행위)로 소송을 못합니다. 제6호 사유로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에 관한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 (법원이 인정한 외도의 기준)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실질적으로는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자녀에게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아주 오랜 세월(예: 46년 별거)이 지나 유책성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책임이 약화된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잘못한 배우자가 이혼 청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되는 경우)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전체 절차와 실무상 여러 쟁점에 관하여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