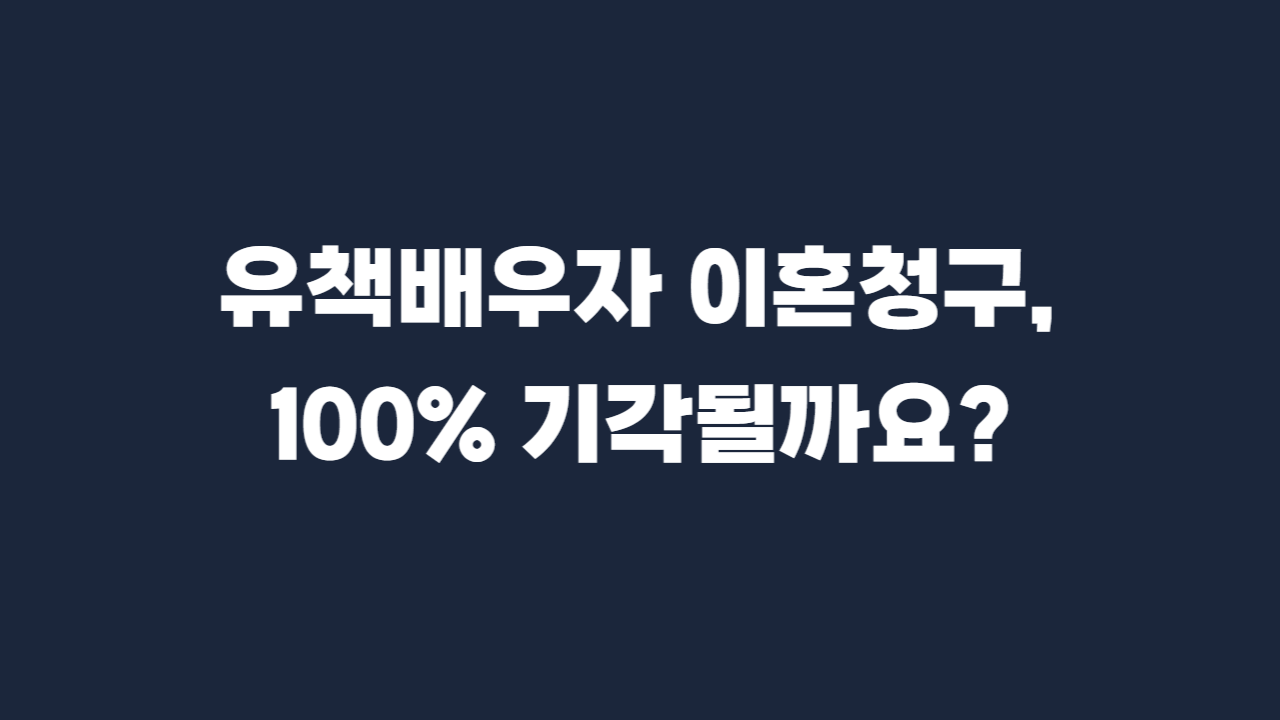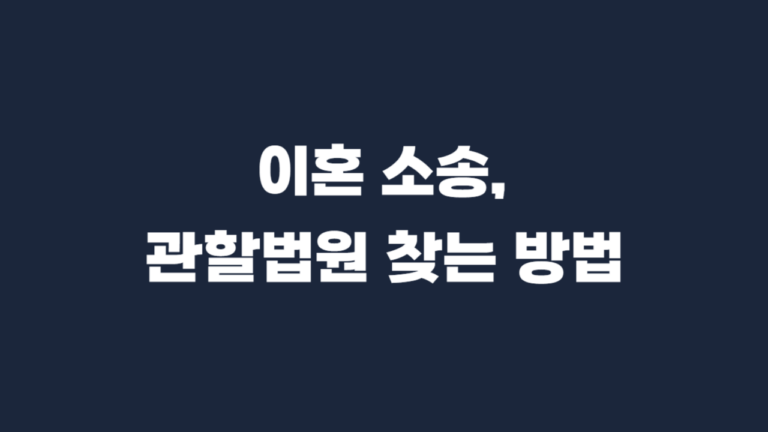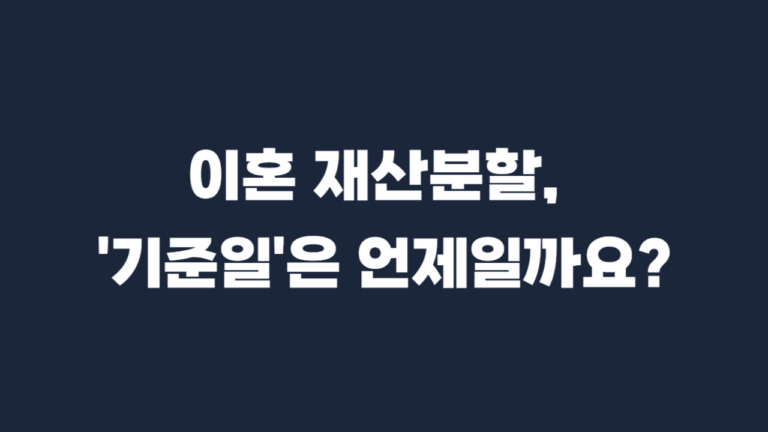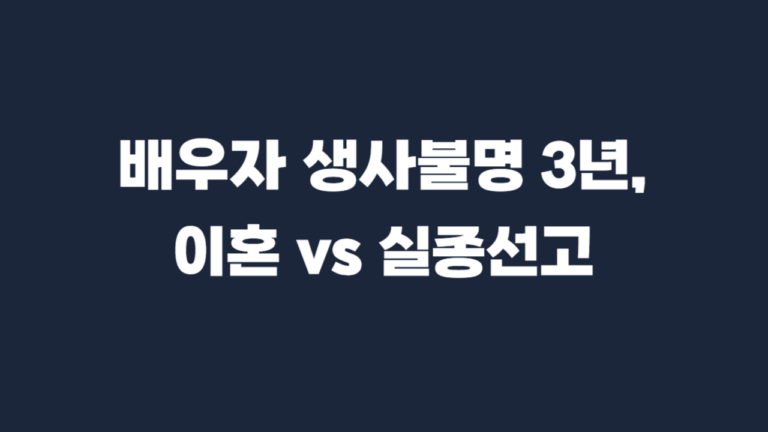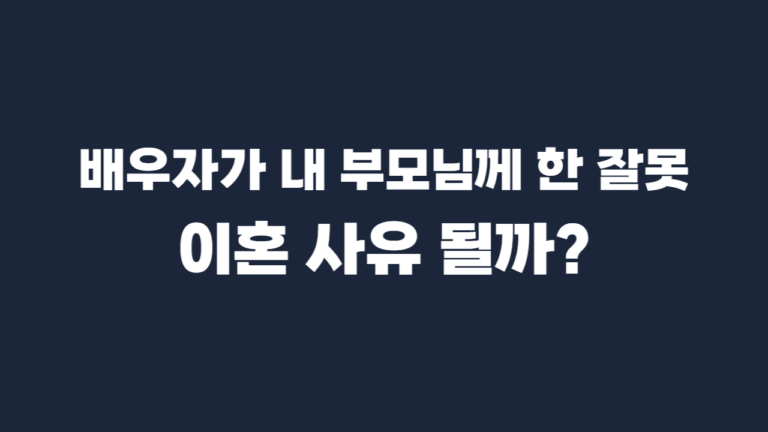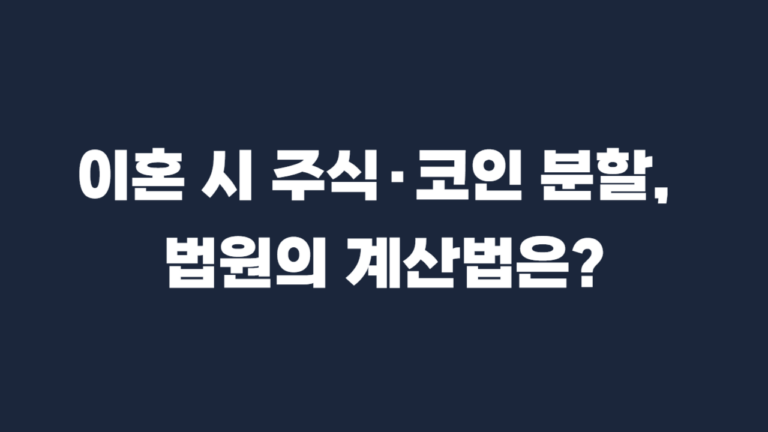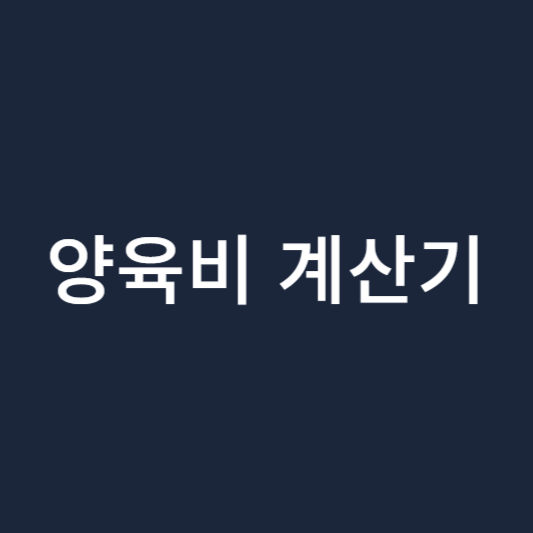잘못한 배우자가 이혼 청구?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인용되는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을 당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잘못(외도,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잘못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법원이 ‘유책주의’ 입장에서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왜 원칙적으로 기각되는지,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원칙: 잘못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법원은 왜 기각할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혼인 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므3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
- 신의성실 원칙 위반: 스스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며 법의 기본 원칙인 신의성실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 축출이혼 방지: 잘못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여 잘못 없는 배우자를 혼인 관계에서 내쫓는 부당한 결과(축출이혼)를 막기 위함입니다.
- 잘못 없는 배우자 보호: 혼인 파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 배우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유책배우자)이 나(잘못 없는 배우자)의 잘못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더라도(예: 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더 크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예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특별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각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1: 나에게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잘못 없는 배우자 역시 실질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내가 단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혼인 계속 의사 없음’의 판단 기준:
- 단순히 소송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법원은 혼인 생활의 전 과정, 별거 기간, 재산 관계, 이혼 소송 중 나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나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예외 사유 2: 상대방의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막을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2015년 판례 변경)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 예외를 좀 더 넓혔습니다. 즉,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면 상대방의 과거 잘못(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나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 상대방(유책배우자)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랜 기간 동안 나와 자녀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 충분한 보호와 배려(경제적 지원, 양육 책임 이행 등)를 해 온 경우.
- 세월의 경과로 인한 유책성의 약화: 혼인 파탄 당시에는 상대방의 잘못이 컸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수십 년 등) 그 잘못의 무게가 희석되고 내가 겪었던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치유되어, 이제 와서 누구 책임이 더 큰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된 경우
- 남편의 여자 문제로 16년 이상 별거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고, 남편이 아내와 자녀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과 배려를 해 온 경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므721 판결).
- 일방적으로 가출한 남편에게 혼인관계 불화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24년 혼인기간 중 13년 이상 별거중이고 아내의 혼인유지의사가 불분명하다고 보가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후 5년 동안 유책배우자를 비난하면서 먼저 돌아오기만을 요구한 경우(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 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랜 기간 경영권을 둘러싼 소송과 경제적 분쟁만이 이어져 온 경우(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 혼인기간 중 10차례나 협의이혼, 이혼소송 절차가 반복되고,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에 대하여 폭언을 하는 등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법원의 요청에 불구하고 면접교섭, 양육환경조사, 부부상담 등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경우(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므11818 판결)
주의: 유책성 판단 기준
상대방 배우자가 부정행위 등 잘못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상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 등을 하였어도 유책배우자가 아닙니다.
- 쌍방 책임이 대등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항상 상대방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잘못이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 못지않다고 판단되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게 되어 유책배우자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 등 잘못이 혼인파탄 이후의 일인 경우: 혼인파탄이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는 혼인파탄에 이르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혼인파탄 이후의 일은 유책성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가 부정행위 등을 하였어도 그것이 혼인파탄 이후의 일로 평가된다면 상대방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핵심 요약
- 원칙 기각: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 예외 인용 경우: 다만, 나 역시 혼인 계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오기/보복심 제외), 상대방의 잘못이 오랜 세월과 노력으로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 유책성 판단: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가 부정행위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의 잘못도 그에 못지않거나, 이미 혼인파탄 이후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은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저도 잘못이 있긴 한데, 상대방 잘못이 더 큽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걸면 기각시킬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쌍방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책임의 경중을 따집니다. 상대방(이혼 청구자)의 책임이 나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등).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비적 반소의 형태로 청구하여 같은 절차 내에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혼 기각판결 이후 유책배우자에 비난을 계속하며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등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 된 경우, 이미 혼인이 와해되어 회복가능성이 없고 설득, 협의에 의한 이혼도 불가능해진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와 실무상 여러 쟁점에 관하여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글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